요즘도 그만둘 듯 그만두지 않을 듯 PT를 어설프게 나가고 있다. 얼마 전에는 선생님이 스쿼트 15회 후 바로 누워서 복근운동 30회를 하라고 시켰다. 나 딴에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스쿼트 후 복근운동 자세를 취하는 동작이 선생님 눈에는 너무 느렸나 보다. (좀 어슬렁 하긴 했다) 계속 한 마디 하고 싶어 안절부절못하더니 결국 “충청도 아가씨답게 왜 이렇게 느려” 한 마디 했다.
반사적으로, 아버지가 충청도 토박이고 물론 나도 충청도 가까운 경기도에서 학창시절을 보내긴 했지만, 내가 충청도 사람이라고 할 수 있나? 하는 의문과 충청도 사람이라고 느리다고 판단하는 건 편견이라는 반감이 들었다. 그치만 뭐 그런 이야기를 줄줄 하기 싫어서 그냥 “나이를 봐선 아가씨가 아니라 아줌마라고 하셔야죠 ㅎㅎ”로 대응했더니 “결혼 안 했으면 다 아가씨지.” 라는, 참으로 판에 박힌 듯한 대꾸가 돌아와서 흥 웃고 말았다. (예전 같았으면 아가씨 운운했을 때부터 입에 거품 물고 반응했을 텐데 늙었다.)
그러고 나서 종종 그 말이 생각이 났다. 시답잖게도 정말 내가 ‘충청도 아가씨’였을까? 하는 아이디어가 뇌리에 스며들고 만 것이다. 실제로 그 말을 듣고 돌아보니 내 행동이 왠지 한두 박자 느린 측면이 있었다. (역시 자캐 해석은 사람을 현혹한다.) 행인 사이를 걸을 때 늘 뒤처지고, 최근에는 나름 큰 엘리베이터 사고가 났을 때 너무 놀라는 티를 내지 않아서 주변의 경탄을 사기도 했다. (반응이 늦어서 그렇지 놀라고는 있었다) 핸드폰을 쓴 지 어언 20년이 가까워가는데도 상대방이 답답할 정도로 세상 굼뜨게 타자를 치고, 레이싱 게임을 오래 해도 맨날 꼴지만 하는 나의 반응 속도, 과연 ‘충청도 아가씨’라서였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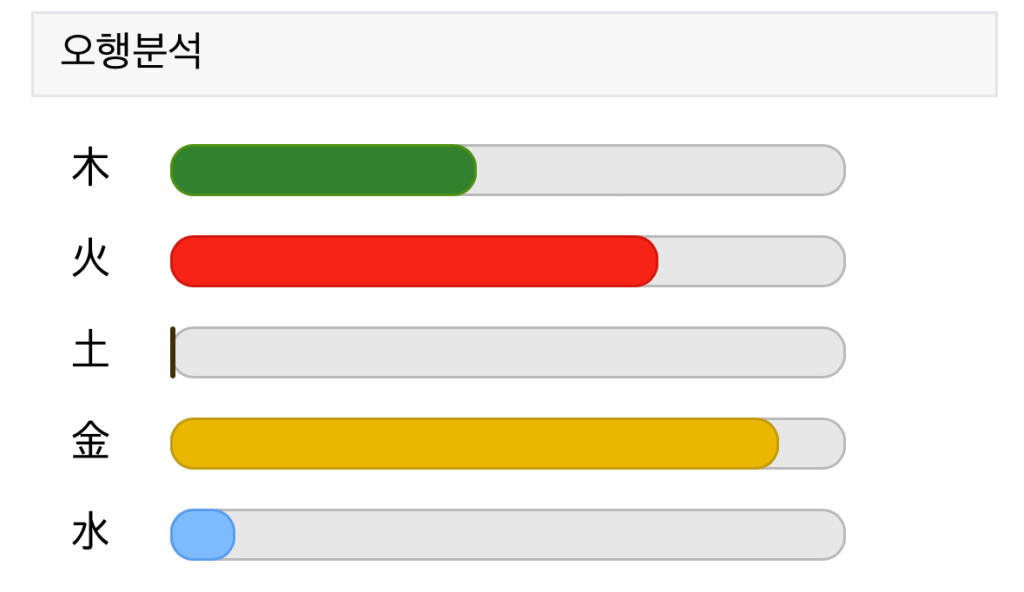
나 같은 유사 충청도인과 달리 아버지는 충청도인의 전형에 딱 일치하는 사람인데 어머니의 웃음벨 에피소드 중엔 이런 것도 있다. 어느 날, 웬만하면 느긋하게 차를 운전하는 아버지가 옆에 어머니를 태우고 차를 운전하는데 앞 차가 계속 부산스럽게 차선을 옮겨가면서 서두르고 있었다. 뒤에서 그걸 한참 지켜보던 아버지 왈, “아 그렇게 급한 것이면 어제 오지 그랬슈~” (어머니 한정 깔깔 유머)
또 어머니가 약간의 불평을 담아 말씀하시길, 아버지는 친구와 만나기로 약속을 정할 때도 답답하기 그지없단다. 예컨대 친구 쪽에서 “19일에 얼굴 한번 보자”라고 하면 “어어… 어. 알겠어” 하고 통화를 끝낸다는 거다. 어머니가 듣기엔 어디서 몇 시에 만날지 딱 정해서 그때 보자! 라고 도장을 쾅쾅 찍어야 약속이 성립하는데 최소한 “좋아”도 아니고 그냥 “알겠어”란 답은 대체 뭐냐는 거다. 어머니 불평을 들으며 나도 약간 뜨끔했다. 사회화되어 아버지 정도는 아니지만, 나도 사실상 비슷한 방식으로 약속을 잡는 편 같았기 때문이다…
근데 내가 그동안 스스로를 느린 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밥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먹고, 어설픈 수준이나마 어떤 스킬을 익히는 거나 환경에 적응하는 거나 빠른 편이고, 샤워도 빠르게 한다. 그런데 나열해놓고 보니 이 모든 건 바로 아버지의 특성이었다. 나는 가당찮은 ‘충청도 아가씨’ 운운할 게 아니라 그냥, 놀랍지 않게도, 아버지를 소름끼치게 닮아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 아버지와 닮았다는 걸 깨닫는 순간은 새삼스럽지도 기쁘지도 않지만 가끔 강력한 설득력을 가지고 내 행동을 설명할 때가 있다. 인간은 참으로 동물이고… 위 세대 개체의 특성을 타고 태어난 나도 참으로 동물이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제나름의 멋을 뽐내면서 길 가는 사람들의 무리가 되게 개미떼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런다. 그건 조금 하잘 것 없기도 하고, 징그럽기도 하고, 평화롭기도 한 그런 기분이다.

댓글 남기기